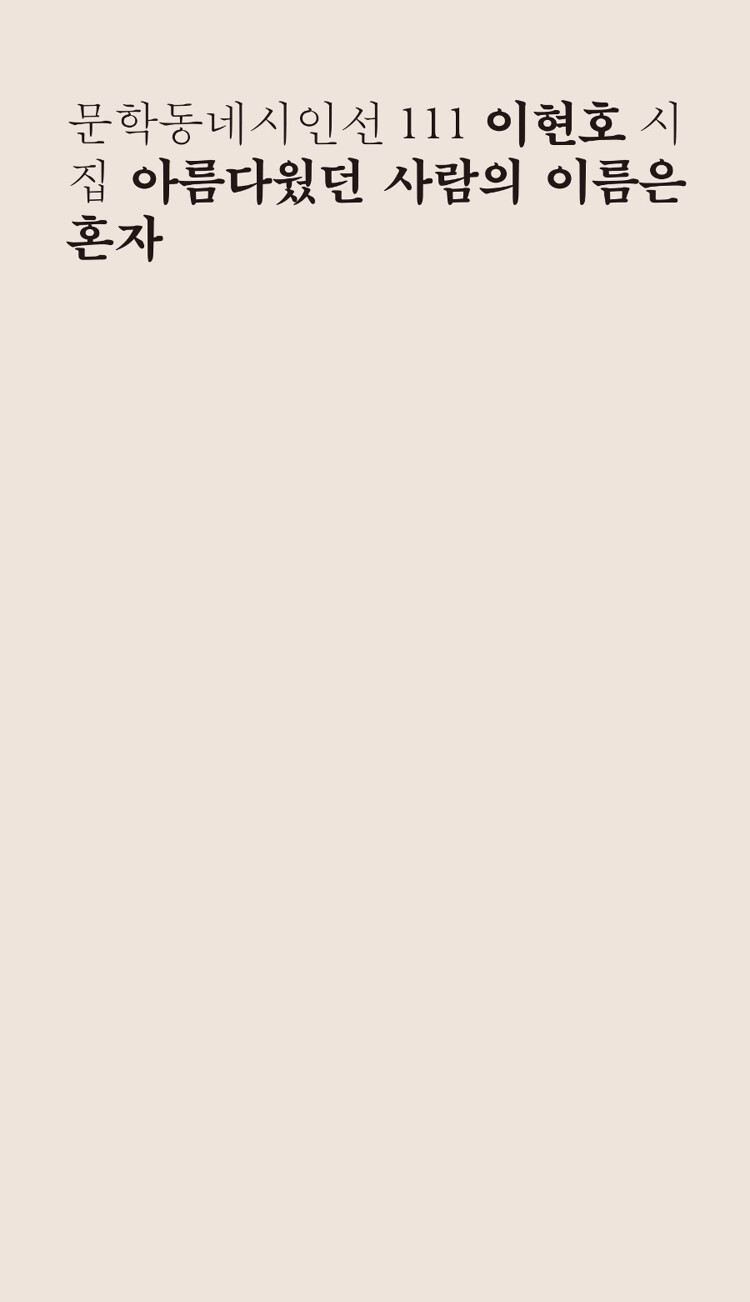
[사진 출처: 알라딘]
사람이 가장 아름다워 보일 때는 언제일까?라는 물음표 근처를 서성거릴 때 이 시집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랑 만나고 집에 오면 알 수 없는 공허함에 현타가 온 적이 있기도 했고, SNS에 자신의 일상과 자랑거리를 쉽게 노출하는 현대사회에서 행복의 기준을 사회에 맞춰가는 스스로를 발견하면서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만의 시간도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이현호 시인은 《라이터 좀 빌립시다》 시집, 《방밖에 없는 사람 방 밖에 없는 사람》 에세이와 같은 책들을 써냈습니다.
시의 특징으로는 '예민하고도 섬세한 언어 감각을 바탕으로 미어질 만큼 슬프고, 아릴 만큼 달콤한 시' 들을 써왔습니다.
이 시집은 표정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얼굴 같은 시집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시를 소개하기 전에 이현호 시인의 말을 먼저 살펴보면,
하나의 가슴에 둘의 심장이 뛴다
그다음은 세계
그 하나 둘 세계
네게
-2018년 어느 날
이현호-
하나에서 하나가 더 합치면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된다는 건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좋았던 시를 몇 개 소개하자면
그대가 풀어놓은 양들이 나의 여름 속에서 풀을 뜯는 동
안은
삶을 잠시 용서할 수 있어 좋았다
·······
그러나 지금은 올 것이 온 시간
꼬리가 긴 휘파람만을 방목해야 하는 계절
주인 잃은 고백들을 들개처럼 뒤로하고
다시 푸르고 억센 풀을 어떻게 마음밭에 길러야 한다
·······
살기 위해 낯선 곳으로
양들이 풀을 다 뜯으면 유목민은 새로운 목초지를 찾는다
지금은 올 것이 오는 시간
양의 털이 자라고 뿔이 단단해지는 계절
「양들의 침묵」
7월 여름 속에서, 여름의 계절감을 느끼며 읽을 수 있었던 시였습니다.
'나'라는 화자가 만들어놓은 여름의 계절 속에서 삶을 잠시 용서할 수 있어 좋았다는 문장을 읽으며 마음에 들지만은 않은 삶에서 물러섬과 동시에 삶을 잠시 용서하는 일은 필요한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와닿았던 문장이 많았는데 특히 '주인 잃은 고백들을 들개처럼 뒤로하고' '다시 푸르고 억센 풀을 어떻게 마음밭에 길러야 한다'는 문장이 와닿았습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억센 풀을 마음밭에 길러야 한다는 것은 즉, 거친 마음을 길들여야 한다고 느껴졌습니다. 또한 '여름'이라는 계절을 통해 양들의 침묵을 잘 연결 지어 나타낸 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다음으로 소개하고 싶은 시는 '아무도 아무도를 부르지 않았다'라는 시입니다.
·······
울음은 울음답고 사랑은 사랑답고 싶었는데
삶은 어느 날에도 삶적이었을 뿐
너무 미안해서 아무 말 않고 떠났으면서
너무 미안하다 말하려 너를 서성이는 오늘 같은 지난날
아름다운 너를 돌아서면 언제까지나 지옥을 걷는 기분이
니까
·······
아무도 아무도를 부르지 않아서
아무 일도 없었다, 지옥과 지옥은
「아무도 아무도를 부르지 않았다」
담담하고, 솔직해서 더 슬픈 것들이 있습니다. 이 시가 제게는 그러했습니다.
감추는 것이 어른이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부터 모든 감추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사랑을 감추고, 표현을 감추고, 감정을 감추고. 그럼에도 익숙해지지 않는 마음이 몰려올 때면 삶을 속이며 살아가고 있나 자책할 때도 있었습니다.
사랑의 끝은 이별.
이라는 불변의 법칙을 온전히 깨달은 뒤에야 온전히 마음을 주는 일이 쉽지 않아졌습니다. '아름다운 너를 돌아서면 언제까지나 지옥을 걷는 기분이니까'와 같은 문장처럼 떠나고, 떠나보내는 일은 언제나 달갑지 않은 일입니다.
아무도라는 이름과 아무도의 의미를 연결 지어 '아무도 아무도를 부르지 않아서' '아무 일도 없었다, 지옥과 지옥은' 문장은 이중성이 잘 드러난 문장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시는
아름다운 사람을 보았다
나는 불행해졌다
아름다움은 무슨 색일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아름다운 사람은 아름답게 가꾼 사람이 아니라
아름다움이 빚은 사람 같고
나는 내가 되고 싶은 내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여서
세상은 눈부신 불행으로 환히 지워지고
나는 아름다운 사람을 향해서만 살아남자고 다짐했다
·······
아름다웠던 사람의 이름은 혼자였고
혼자와 더불어 나는 혼자였다
날이 밝으면 나도 혼자처럼 아름답고 싶어요
·······
살아 있는 무대의
빛 속으로
「살아 있는 무대」
이 시를 읽으며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내면이 단단해서 그게 겉으로까지 드러나는 사람. 그런 자신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볼 줄 아는 사람이 내면도 외면도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게 삶이라고 해도. 가끔은 온전히 혼자만의 시간도 즐기며,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자신의 삶을 무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 아닐까 생각하게 만든 시입니다.
우리는 누구랑 같이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 더 아름답습니다.
'혼자'라는 이름의 발자취를 따라 걷다 보면 이 시집을 읽고 있을 것입니다.
'시집'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시집 소개] 《아주 커다란 잔에 맥주 마시기》-김은지 (0) | 2024.08.22 |
|---|---|
| [시집 소개] 《희지의 세계》-황인찬 (1) | 2024.07.19 |
| [시집 소개] 《일하고 일하고 사랑을 하고》-최지인 (4) | 2024.07.10 |
| [시집 소개] 《에코의 초상》-김행숙 (0) | 2024.06.26 |
| [시집 소개] 《이 집에서 슬픔은 안 된다》-김상혁 (0) | 2024.06.23 |



